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인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한국거래소에서 통보해주는 사건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불공정거래 조사를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감원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45건으로 거래소에서 통보해준 사건(126건) 보다 많았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 2009년 55건을 기록해 거래소 통보사건인 180건에 30.6%에 그쳤고 2010년 자체인지 65건, 거래소 통보 129건, 2011년에는 자체인지 71건, 거래소 통보 151건 등 지속적으로 격차를 유지했다.
통상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건은 거래소에서 적발 한 뒤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한다. 이후 정식조사와 심의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통보하고 고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전까지는 거래소가 통보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자 ‘특별조사반’을 만드는 등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별조사반’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정치테마주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증선위에 보고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다만 검찰에 고발·통보한 주가조작 사건은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찰에 고발·통보한 전체 주가조작 사건은 76건으로 전년보다 62% 급증했다. 검찰이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소율 역시 2009년 73.7%, 2010년 80.2%, 2011년 73.6%, 작년 82.4%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며 양형 기준이 높아진 면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건이 지체되며 증거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 처벌하려고 봤더니 이미 파산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법도 없어 실질적인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독] 삼성전자, AI 챗봇 서비스 ‘나노아’ 본격 적용…“생성형 AI 전방위 확대”](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1069.jpg)
![김호중ㆍ황영웅 못 봤나…더는 안 먹히는 '갱생 서사', 백종원은 다를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117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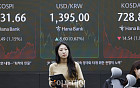
![점점 오르는 결혼식 '축의금'…얼마가 적당할까?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1166.jpg)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745.jpg)
![현대차·도요타도 공장 세우는 ‘인도’…14억 인구 신흥시장 ‘공략’ [모빌리티]](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567.jpg)










![[오늘의 주요공시] 고려아연‧이리츠코크렙‧펄어비스 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101237.jpg)

![[급등락주 짚어보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일제히 ‘상한가’](https://img.etoday.co.kr/crop/85/60/2101211.jpg)


![[정치대학] 尹대통령, 최저 지지율로 임기 반환점…결정적 패착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1165.jpg)
![2500선 내준 코스피, 1400원 넘어선 환율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12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