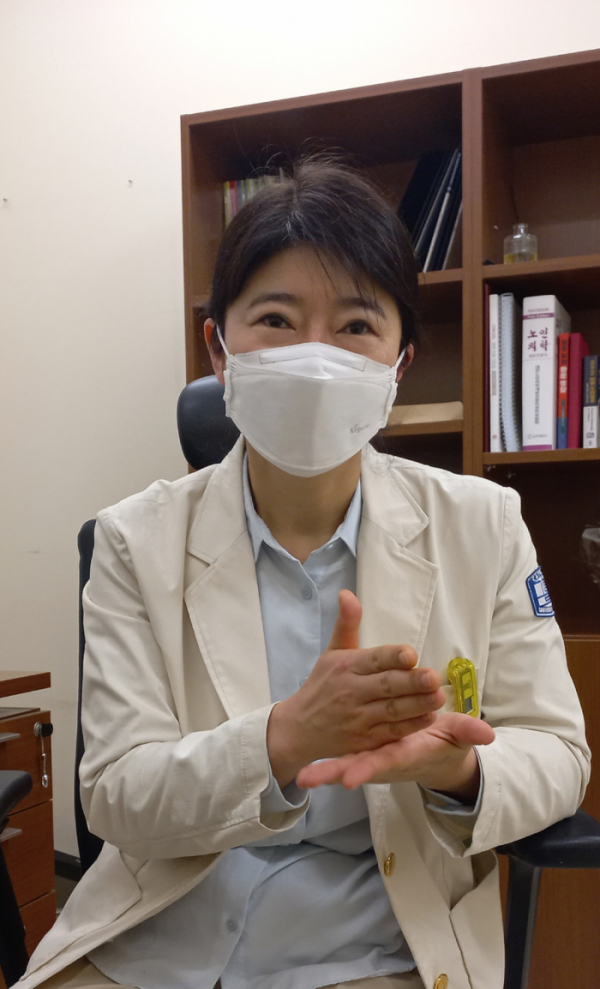
“현재 의료용 마약류 정책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의료계 비판이 높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투약 기록 확인 의무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진료와 치료에 방해가 될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휴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고민하기 전에, 기존의 제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실에서 박 교수를 만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정책의 허점을 짚어봤다. 박 교수는 대한통증학회 학술이사와 대한통증연구학회 홍보이사를 역임했으며, ‘아편유사제 처방지침’ 제정에 참여한 바 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선결 과제가 산적했다. 우선, 식약처의 NIMS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오남용 의심 처방 사례를 정교하게 걸러낼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처방 이후 의약품 회수·폐기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박 교수는 “임상 현장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지 않은 제도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식약처의 '마약 쇼핑' 차단 전략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이다. 마약 쇼핑은 마약 중독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수차례 처방받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NIMS와 DUR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책을 제시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의약품 처방 내역이 기록된 두 시스템을 대조해 중복 처방 여부를 확인하면 마약 쇼핑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기대다.
하지만 진료실의 상황은 식약처의 기대만큼 녹록지 않다. 이른바 ‘5분 진료’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촉박한 시간 내에 각각의 시스템을 대조하며 환자를 진료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두 개의 화면에 각 시스템을 켜 놓고, 환자를 진료하면서 처방 기록까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며 “DUR 내에서는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 있으면 팝업창으로 알림이 뜨지만, NIMS와 DUR 사이에는 연계된 알림 기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적발할 수단도 엉성하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NIMS를 구축해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투약 정보를 보고받고 있다. 이에 기반해 보험급여 기준치를 초과한 처방 사례를 포착하고, 해당 의사에게 경고를 보낸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의사는 처방에 대한 소명을 회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발송되는 경고는 대부분 ‘헛다리’라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증 환자를 진료하지만,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를 본다”라며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 사용량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경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처방 사례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건강보험에서 허용하는 펜타닐 패치 용량 기준치는 37.5(mcg/h)이다. 하지만 국내서 사용되는 제품의 용량은 △12.5 △25 △50 세 가지 뿐이다. 박 교수는 “기준치를 준수하기 위해 12.5용량 1장과 25용량 1장 등 2장을 처방하면 ‘중복 처방’이라는 경고가 뜬다”라며 “펜타닐, 타펜타돌 등 여러 마약성 진통제에서 이같이 불필요한 경고와 소명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종양내과 등 4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약 335만 명에서 2022년 459만 명으로 37% 증가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43만 4089명으로 국민 21명당 1명에 달한다.
박 교수는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점점 줄어들까 우려된다”라며 “평소 투약해 왔던 의약품의 용량을 갑자기 줄이면 환자들은 극심한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고, 통증 재발이나 경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매번 식약처의 경고를 받은 의사 이름과 처방 건수를 공지하고, 소명 요청 메일을 보내면 의사들의 소신 진료도 위축되기 마련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은 의사뿐인데,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마약 정책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는 하나도 없다”라며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단독]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5043.jpg)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5286.jpg)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5320.jpg)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5118.jpg)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5216.jpg)







![“만두 1위 굳히기”…CJ제일제당, 미국·헝가리에 비비고 공장 세운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105188.jpg)
![‘K뷰티 랜드마크’ 성수 상륙...올리브영N엔 건강·美 가득[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105193.jpg)






![[정치대학] 이재명 대안은 김부겸·김동연?…박성민 "둘 다 명분 없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5457.jpg)
![서울 명동 임대료, 세계 9번째로 '비싸'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5411.jpg)